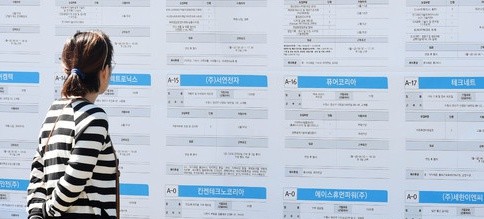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의 청년실업난은 ‘취업 빙하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보다는 백수를 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실업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와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38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월 432만원)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질 나쁜 일자리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 2015년 5만3000명이었던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올해에는 17만명으로 늘었다.
이같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한국 청년들은 구직기간이 길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선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낫을 수 밖에 없고, 점차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는 점은 한국 청년층의 실업기간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본 청년 실업률, 7년 만에 ‘역전’
과거 한국과 똑같이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일본은 최근 청년실업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7.1%로, 한국 천년 실업률(6.9%)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9.5%로 오른 반면, 일본은 4.1%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일본이 청년실업 문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가 일관된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을 펼친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를 넘는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보다 대기업 일자리가 많다. 일본의 경우 관공서 근무자를 제외한 전체 취업자의 24.3%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관공서를 포함하더라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비중이 14.3%에 머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프리터(Freeter,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합성어)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정보·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 공공직업소개소 운영, 청년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구직·구인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청년 실업 대책을 추진한 점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며 “한국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