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자유와 억압’ 사이를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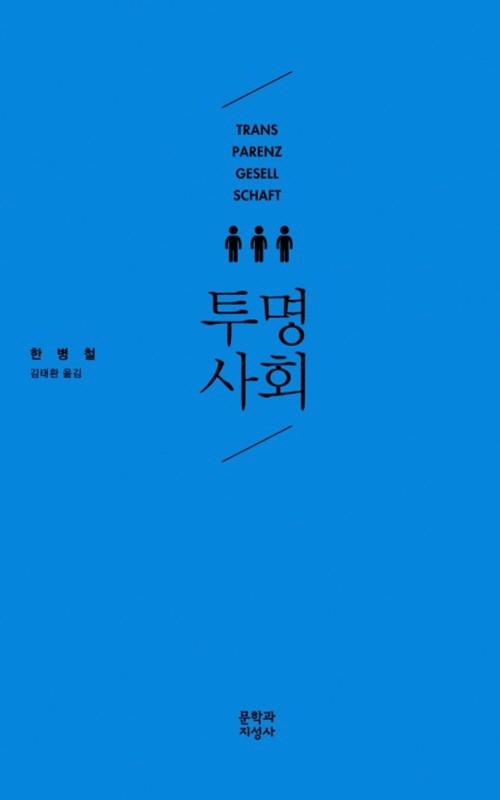
[스페셜경제=현유진 기자]<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 교수가 신작 <투명사회>를 통해 현재 사회의 시스템의 깊이있는 고찰을 맛보게 만들고 있다.
<투명사회>는 ‘투명성’에 대한 독일 사회의 주류 담론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Transparenzgesellschaft(투명사회)>와 우리 삶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온 디지털 문명에 대한 진단을 제시한 <Im Schwarm. Ansichten des Digitalen(무리 속에서—디지털의 풍경들)>(2013)을 번역하여 한 권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투명성의 전체주의적 본질에 대한 전복적인 성찰을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투명성은 ‘신자유주의의 요구’다. 투명성은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밖으로 표출시키고 정보로 전환시키는 반면 낯선 것, 모호한 것, 이질적인을 해체시킨다.
<투명사회>는 부패 근절과 정보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결코 깨달을 수 없을 투명성의 시스템적 폭력성을 한병철 특유의 간결한 문체로 날카롭게 파헤친다.
‘투명성’…자유 아닌 통제
오늘날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들은 투명성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정보의 자유,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한다. 최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정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개되고 무제한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투명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자 한병철은 <투명사회>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로 간주되어온 투명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투명사회가 새로운 통제사회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투명사회는 우리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상태인 ‘디지털 파놉티콘’으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의 거주민들은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심지어 그것을 ‘자유’라고 오해한 채 스스로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본질에 대한 예리한 통찰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모든 사회적 과정을 조작 가능하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명성을 강요한다. 이에 조직원들은 투명사회에서 점차 타자가 소멸되고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강화되는 모습을 띤다. 투명사회 속에서 구성된 조직원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부정성이 갖지 못한 채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화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관리하는 역할로 축소되고 만다. 선거와 쇼핑은 비슷해지고, 통치도 마케팅에 가까워진다.
저자는 <투명사회>를 통해 모든 것이 겉이 되어가는 사회, 진리는 없고 정보만이 있는 사회, 낯선 타자와 직접 맞닥뜨릴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오직 자신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진 것만 상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나르시시즘적 사회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낸다.

